스마트워크,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다
New Way of Working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총칭하는 ‘스마트워크’는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 간혹 스마트워크를 재택근무나 자율좌석제와 같은 방법론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대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본질적인 의미는 그대로 담겨있다. 협소한 의미의 방법론과 헷갈리지 않도록 ‘일하는 방식의 변화’ 혹은 ‘New Way of Working’이라고 부르는 회사도 있다. 2011년, 유럽에서 배운 스마트워크를 처음 한국에 소개할 때는 스마트워크가 스마트폰으로만 일하는 거냐고 묻는 임원도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질문이 없다. 그러고 보니 정부와 기업이 스마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시작한 지가 올해로 10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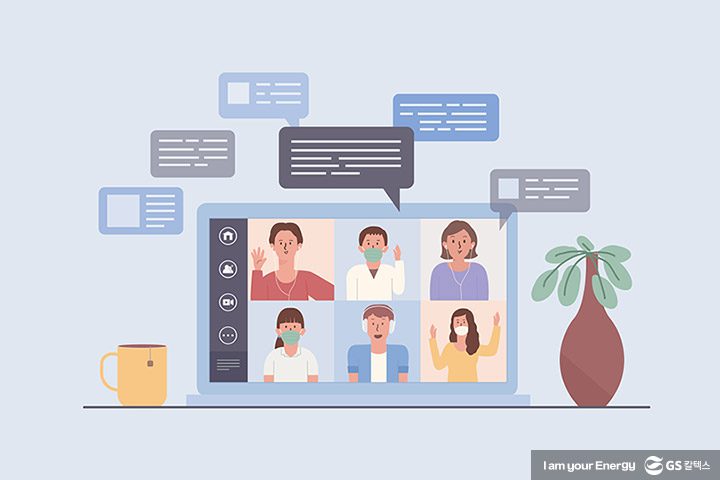
2010년 초창기의 스마트워크는 ICT 기술 도입에 방점이 있었다. 수천만 원짜리 화상회의실을 구축하는 게 유행이었고, 그다음엔 직원들에게 태블릿 같은 모바일 업무기기를 지급했다. 2010년 중반부터는 IT 기기보다는 업무 환경의 변화를 통해 조직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규모가 있는 중견. 대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 오피스 구축이 활발히 시작됐다. 개인 차원의 효율을 높이는 워크스마트(Work Smart)와 조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워크(Smart Work)로 구분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다. 그리고 올해,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으면서는 재택근무로 대표되는 리모트 워크(Remote Work)가 급부상했다. 사실 리모트 워크는 임원의 인식, 기업의 제도, 직원의 경험 –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한 것이라 스마트워크의 방법론 중에서도 가장 뒤늦게 도입될 거라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그 시기를 수년이나 앞당겼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면서 ‘일’의 의미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코로나 이전까지 ‘일’은 곧 사무실에 가는 것이었다. 내 책상에 앉아서 일과 관련된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 자체를 일이라 생각했다. 새벽에 출근하거나 야근이 습관인 직원들에게는 의심 없이 ‘열심히’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그러나 매일 출근을 할 수 없고, 직원들이 어디에서 일하는 지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일의 의미가 달라졌다. 단순히 내 자리에서 뭔가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성과와 연결된 의미 있는 뭔가를 하는 것’으로 일이 재정의 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형식을 넘어 본질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은 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이자 진화의 과정이라는 걸. 그래서 국내. 외 많은 기업들이 채용, 성과평가, 업무방식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독일 복합기업 지멘스의 스마트워크
독일 기업 지멘스(SIEMENS)는 그런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회사 중 하나다. 지멘스는 자동차, 에너지, 전력, 철도 등 다양한 사업부문을 커버하는 독일의 복합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48만 명의 직원이 일한다. 이번 COVID-19 기간 동안 지멘스도 회사도 부득이하게 재택근무를 단행했는데 처음이 어렵지 한번 익숙해지니 의외로 이점이 많았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리모트 워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직원들 역시 이를 바라고 있었다. 전 세계 지멘스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직원이 업무 공간에 대한 폭넓은 선택권과 개인화된 솔루션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회적 위기가 더 광범위하게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멘스는 COVID-19 기간에 전략, 인사, IT, 부동산 부서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새로운 업무 가이드인 ‘New Working Model’을 개발했다. 이 모델의 핵심 내용은 주 2-3일의 리모트 워크로 전 세계 43개국에서 일하는 14만 명의 지멘스 직원들에게 즉시 적용된다.
지멘스는 이번 변화를 준비하면서 직원들의 원격근무를 돕기 위한 협업툴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온라인 협업툴이 스마트워크의 토대라는 걸 알고 있어서다. 실제로 스마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기업들을 보면 본격적인 변화에 앞서 오랜 기간 협업툴의 사용 경험을 쌓아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원격 시스템부터 줌(Zoom)이나 MS Teams 같은 화상회의 솔루션, 사내 메신저에 이르기까지 스마트워크를 위해 상용화된 기술과 서비스는 무궁무진하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기업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공간, 기술, 교육 모든 분야에서 협업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그 어떤 변화도 이제는 빠르지 않다
스마트워크의 목적은 단순히 기존의 방식을 바꾸는 것 그 자체가 아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한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더욱 아니다. COVID-19와 같은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일’에 대한 정의 자체가 변했고, 그래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 즉 스마트워크가 필요하게 됐다. 이런 시대에는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조직이 생존할 수 있고, 조직이 생존은 곧 개인의 생존과 직결된다. 변화 속도가 느릴 때 작동했던 과거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이제 비효율을 넘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 조직의 그 어떤 변화도 이제는 빠르지 않다.

다만, 그 변화를 이끄는 방식에는 전략이 필요하다. 스마트워크의 바이블 <언리더십>의 저자 닐스플래깅(Niels Pflaeging)은 변화와 혁신에 대한 통찰을 나눈 한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을 했다.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시도하는 방식이다.” 소수의 임원이나 TFT가 결정한 스마트워크 방법론을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것은 스마트워크 디렉터인 내 입장에서 보면 가장 돌아가는 방법이다. 이런 일방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한 스마트워크가 자칫 값비싼 이벤트로 끝나버릴 수 있다. 일방적인 지시로 인한 실행은 처음엔 빨라 보이지만, 공감이 결여된 변화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좀 느린 것 같아도 스마트워크의 도입에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직원들을 스마트워크의 중요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려면 스마트워크 도입을 결정하기 전에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 스마트워크가 무엇인지, 우리 회사에 왜 스마트워크가 필요한지, 그 과정에서 회사는 어떤 점을 우려하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의 과정을 통해 회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지를 전 직원과 오픈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스마트워크의 첫 단추를 잘 꿰기만 한다면 시대가 요구하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분명 성공적인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다.


